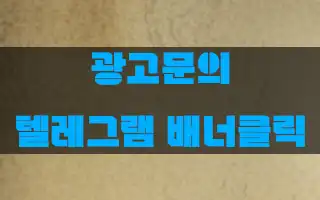인천 다방, 그 쓴 추억 –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유
🕶️ 에피소드 1. 인천 다방에 입성한 촌놈 🐣
그날 나는 서울 촌놈 티를 한껏 내며 인천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.
“커피 한 잔만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…”
간판이 살짝 기울어진 인천 다방을 보고,
“아, 여기 싸고 시원하겠다!” 하고 들어갔다.
문을 여는 순간,
낡은 종소리가 ‘딸랑~’ 하고 울리며
나를 제3의 차원으로 초대했다.
카운터 너머 아줌마가 날 스캔하는 그 눈빛,
마치 “또 왔구나, 오늘의 제물…” 이라고 하는 듯했다.
☕ 에피소드 2. 쎄한 기류와 미소녀 등장 😳
메뉴판을 펼치자 ‘아메리카노 3,000원’이 눈에 띄었다.
“오케이, 오늘 커피도 알뜰하게 마시는구나!”
기분 좋게 주문하려는데,
갑자기 옆 테이블에서
화사한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베트남 여성 두 분이
동시에 고개를 들었다.
그들의 눈빛에는
“오늘의 스폰서님이 오셨군요~”
하는 따스한(?) 기운이 흘렀다.
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.
아무리 봐도 평범한 카페 느낌은 아니었다.
🫖 에피소드 3. “오빠, 커피 사주면 돼요~” 🎯
아무 일 없다는 듯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,
그녀들이 내 옆으로 슬금슬금 다가왔다.
그리고 마치 오래전부터 친구였던 것처럼
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.
“오빠, 커피 사주면 돼요~”
순간, 머릿속이 백지가 됐다.
“나… 오빠인가? 누구 오빠지?”
나는 현실을 부정하며
컵받침만 뚫어져라 바라봤다.
그러나 이미 게임은 시작된 듯했다.
그녀들은 웃고 있었고,
나는 카운터로 걸어가고 있었다.
💸 에피소드 4. 미지의 커피영수증 📜
주문은 분명 ‘아메리카노 두 잔’이었는데,
계산서엔 ‘아메리카노 X4 + 서비스료’가 찍혀 있었다.
“이게 혹시… 다방의 룰인가?”
머릿속에서 ‘아는 형님’ 자막이 떠올랐다.
“모르면 당하는 거야~”
주인아줌마는 나를 향해
오랜 다방 경력에서 우러난 자신감의 미소를 보냈다.
나는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대며
조용히 최면을 걸었다.
“이건… 인생 경험이야… 그렇지… 인생 경험…”
하지만 통장 잔고도 함께 빠져나갔다.
😂 에피소드 5. 웃음과 공포가 뒤섞인 탈출 🏃♂️
커피가 도착하자
그녀들은 내 옆에서 웃으며 잔을 부딪쳤다.
“오빠, 짠~!”
이제 나는 그 다방의 공식 스폰서가 되어 있었다.
머릿속에선 끊임없이
‘왜… 왜… 왜…’
라는 자막이 돌아갔다.
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
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섰다.
햇살이 눈부시게 따가웠다.
뒤에서 그녀들의 합창이 들렸다.
“오빠~ 또 와요~”
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.
“아냐… 안 와… 다시는 안 와…”
그 순간,
세상에서 제일 값비싼 아메리카노 맛이
입안에 남았다.